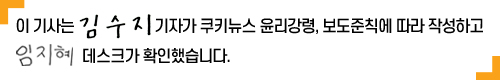코끼리 한 마리 만큼 무거운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무게’가 새로운 안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을 위해 달려온 전동화 흐름이 역설적으로 충돌 위험, 미세먼지, 건축물 안전 등 새로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최근 매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14만2456대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신차 효과와 정부 보조금이 수요를 이끌며 보급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보급 확대 속 ‘무게 논란’
판매 확대 속에서 무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국내에 상륙한 사이버트럭이다. 최근 국내에서 ‘GD차’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3.9톤)이다. 동급 내연기관차 포드 F-150(2.0~2.7톤)보다 1톤 이상 무겁다.
실제로 전기차는 배터리팩이 차량 무게의 20~40%를 차지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전동화되면 수백㎏이 늘어난다. 제네시스 G80은 내연기관 모델이 1785~1965㎏이지만, 전동화된 G80(일렉트리파이드 G80)은 2265㎏으로 300~500㎏ 더 무겁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차량 무게가 450㎏ 늘어날 때마다 충돌 사고 사망 확률이 47%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가교통위원회(NTSB) 제니퍼 호멘디 의장 또한 2023년 “전기차를 포함한 도로 위 차량의 중량과 크기, 동력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 증가를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차량 충격량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전기차는 무게가 무거워 충격의 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이지만 미세먼지는 더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2022년 차종별로 미세먼지를 통합 측정해 발표했다. 소형 SUV를 가솔린, 디젤, 전기차로 나눠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총 발생량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디젤·가솔린)보다 많았다. 가솔린이 1km 주행 시 42.3㎎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반면 전기차는 47.7㎎를 뿜었다. 즉, 배출가스는 줄었지만, 무거운 차체 탓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에서 비롯된 ‘비배기 미세먼지’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전기차 무게 문제는 도로를 넘어 건축물 안전으로도 번진다. 국내 현행 설계 기준은 전기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노후 주차장의 경우 당시 차량 평균 무게가 1톤대에 맞춰져 있어 지금의 전기차 보급 환경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콘크리트 슬래브나 기둥의 피로 누적이 진행된 상황에서, 평균 2톤에 달하는 전기차가 다수 동시에 주차될 경우 하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회장은 “오래된 주차장의 경우 차량 하중을 그 당시 기준에만 딱 맞게 설계한 경우가 많아 현재처럼 전기차 무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력이 떨어질 경우 차량들의 무게 증가로 인해 침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기차의 ‘무게 역설’은 충돌 사고 충격 위험뿐 아니라 제동거리 증가, 비배기 미세먼지, 도로·교량 하중, 노후 주차장 구조 안정성까지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차 안전 논의가 배터리 화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무게가 불러올 리스크를 포함해 교통·건축 인프라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