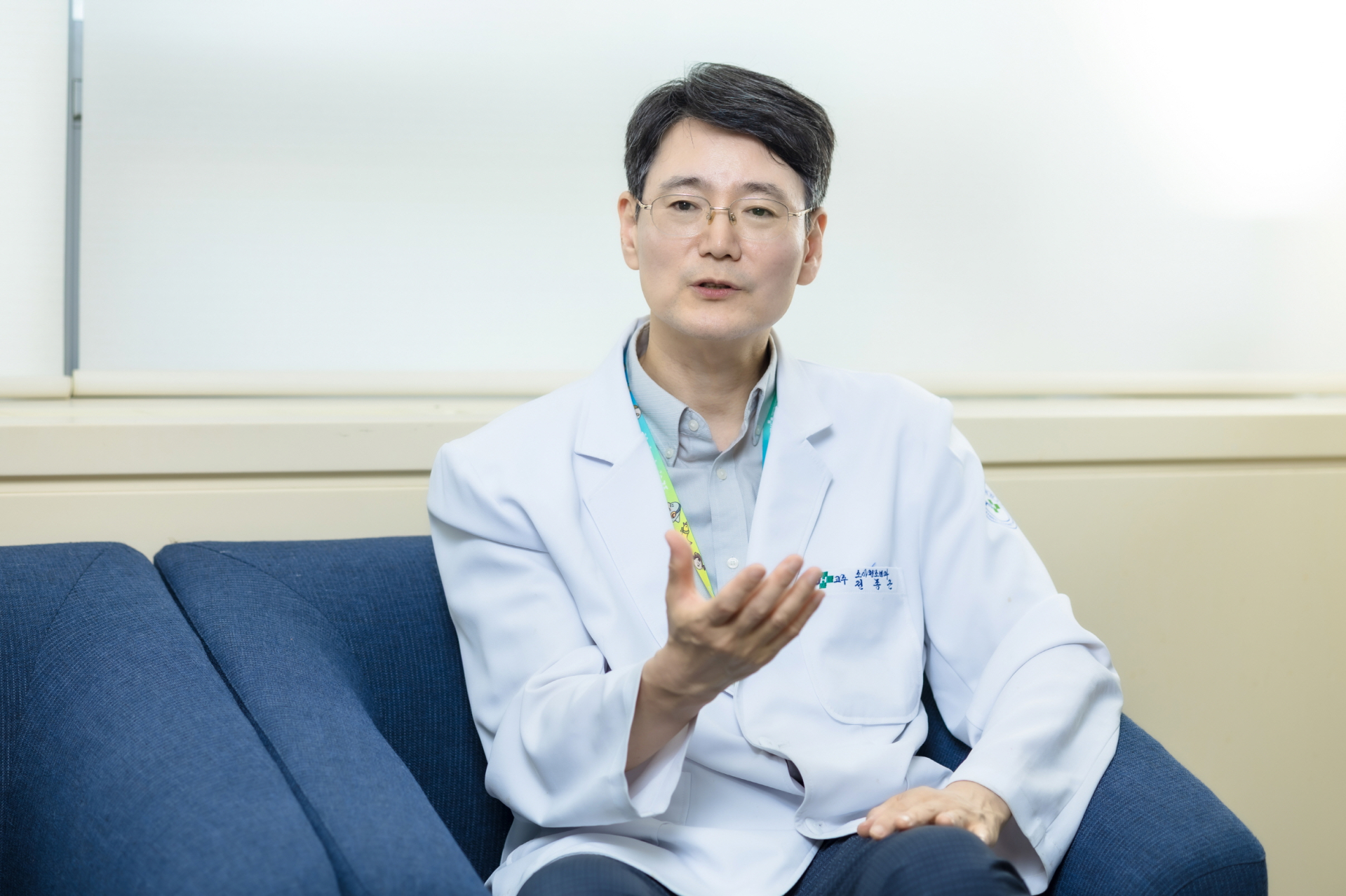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난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보, 지역의료 공백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복학 이후에도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이번 달 중순부터 다시 강의실에 출석하기 시작하며 의대 교육은 정상화되고 있다. 대학들도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을 재검토하고 있어 교내 갈등도 없을 전망이다. 의대 교육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대 교수들은 남은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24·25학번 학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교육 여건은 척박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의실과 기자재가 부족해 24‧25학번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의료 교육 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정원 확대로 24‧25학번 학생 수가 많이 늘었지만, 의대생들을 교육하려면 필요한 강의실과 기자재가 부족하다”며 “예과생들이 본과로 올라오기 전에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독려하지 않으면 의료 교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약 1년 반 안에 의대 수업환경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며 의료 현장 또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 붕괴, 산부인과‧정형외과 등 고난이도 전문과 기피 현상 등은 여전하다.
수도권 지역 병원에는 입대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절반에 그쳤고,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과에는 전공의 수가 부족한 상황은 여전하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기피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 의료 수가제도 개편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진단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이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의료대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장기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