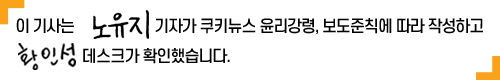‘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규모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직 채용 규모는 늘었지만, 청년층 사이에선 ‘철밥통’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마저 빠르게 조직을 떠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임금 구조와 복지 미비가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1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58만5000명) 가운데 공무원 준비자는 18.2%에 불과했다. 일반 기업체 취업 준비자는 21만1000명으로 공무원 준비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일반 기업 준비생 수가 공시생 수를 앞지른 것은 2006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채용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공직 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4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만1000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1만7665명으로 지난해보다 8.2%(1332명) 늘었다.
설령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공직에 오래 남는 경우도 줄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 입문 후 5년 미만에 퇴직한 공무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대 청년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158명)가 ‘급여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월급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적 있다’는 응답도 9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저연차 공무원 유입 감소와 이탈 확대가 장기화될 경우 공직 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연금과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높은 선호를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연금 수령액이 줄고 처우 개선이 정체돼 흡인력이 떨어졌다”며 “공무원 준비생 수가 채용 인원의 몇 배에 이르긴 해도,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여 인상과 복지 확대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인재가 민간 영역으로 분산되는 흐름 자체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