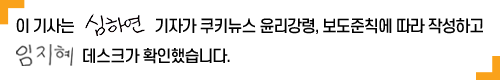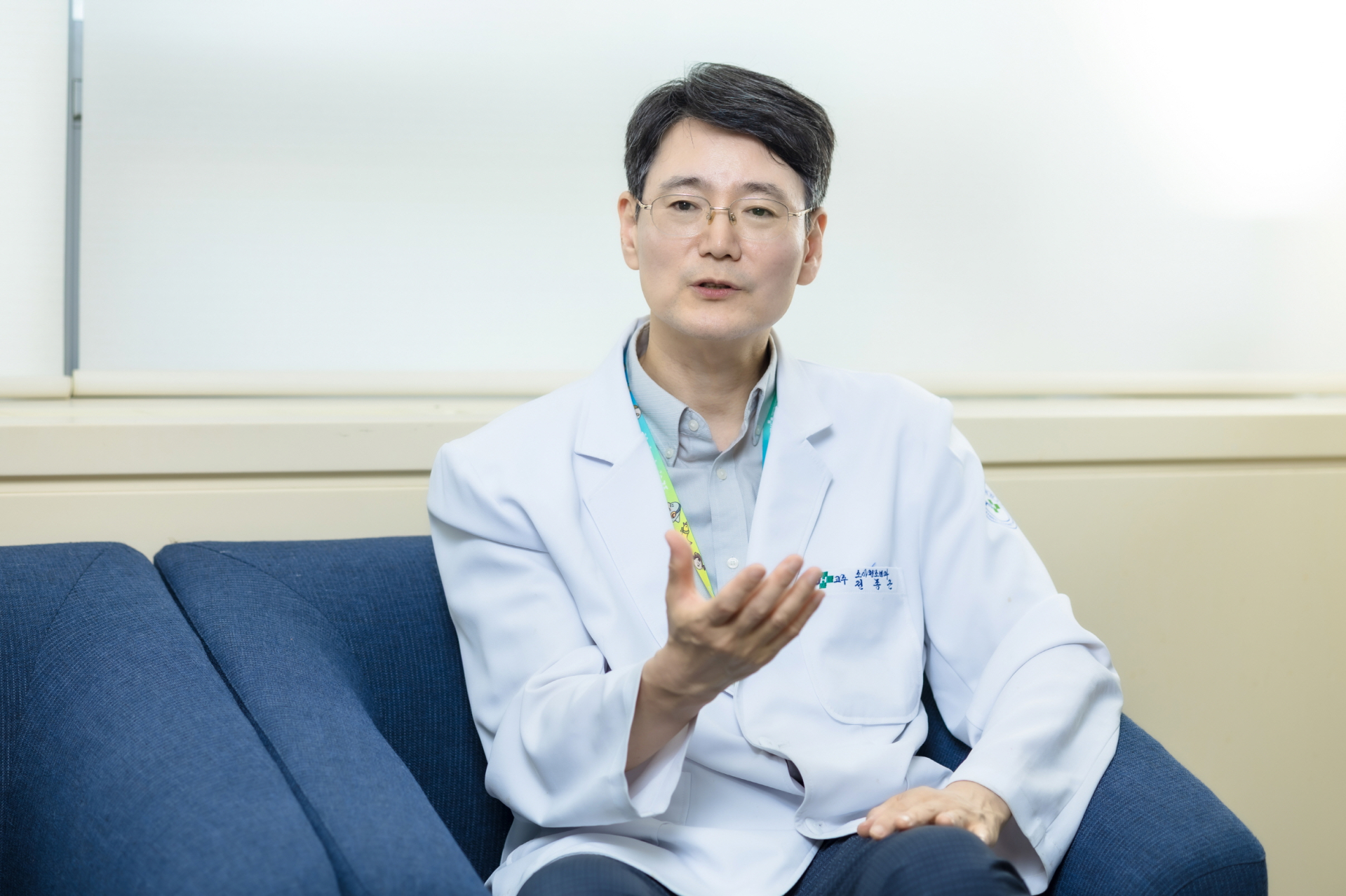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하면서, K-뷰티 업계가 긴장 속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나섰다. 다만 그 안에서도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이미 갖춘 한국콜마·코스맥스 같은 ODM·OEM 제조사들은 일정 부분 방어선을 마련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등 브랜드사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직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가격 조정, 현지 생산 전환, 다국가 우회망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LG생활건강은 “현재 북미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관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도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법인 매출 원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가격 인상이나 프로모션 비용 관리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지 브랜드별 경쟁 환경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나 수출가격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재무나 브랜드 매력도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 중”이라며 “현재 북미 사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물류 투자뿐 아니라 일부 상품 모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긴 호흡으로 보면 향후 5~10년 내 현지 생산시설 확보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한국 화장품이 그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이미지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무기로 북미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곧바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품질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었다”며 “관세 부담이 실제 가격에 붙으면 1000~2000원 같은 소액 인상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다른 브랜드와 다를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리미엄 제품군은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력이 있지만, 대중 제품군은 가격 경쟁력 손실이 곧 구매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브랜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위기다. 한국콜마는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제2공장을 가동하며, 북미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66% 늘어난 연 3억 개 규모로 확장했다. 코스맥스도 미국 뉴저지 코스맥스USA 공장에서 회사 전체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2억8000만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객사에서 (가격 조정 관련) 별다른 요청은 없다”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됐을 때 소비자 반응을 보고, 필요하다면 고객사 요청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으로 물량을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선제적인 증설 계획은 없지만 필요시 증설이 가능할 만큼 여력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생산망 재편 가속화 전망
업계는 이번 관세 리스크를 계기로 K-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망 재편’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현지 직생산뿐만 아니라 유럽·동남아·중동 등 비(非)미국권 매출 비중을 늘려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브랜드사 관계자는 “관세는 단기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라 공급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K-뷰티의 품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현지 생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갑작스러운 보호무역 장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중소 브랜드사들이 개별적으로 현지 공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의 상생 모델과 정부의 수출 다변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