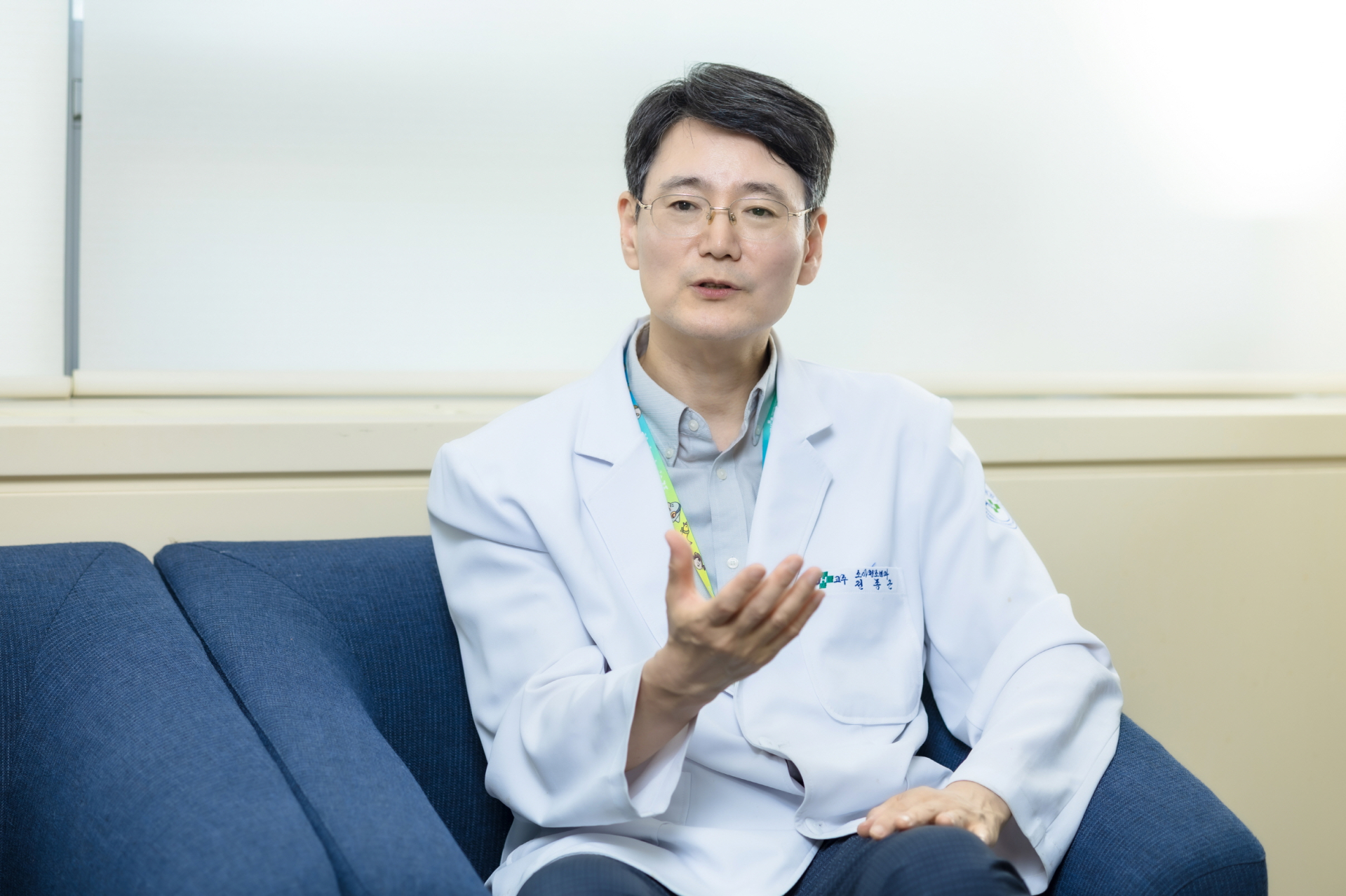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집단대출 규제에 울상을 짓고 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면 타 상호금융권에 밀려 우량 채무자를 찾기 어렵고 그만큼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집단대출 규제에 울상을 짓고 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면 타 상호금융권에 밀려 우량 채무자를 찾기 어렵고 그만큼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애당초 부실한 사업장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도는 자산 수준이나 리스크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예대비율(80~100%)을 충족하지 못한 신협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하기로 정했다. 또한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동일사업장별 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집단대출을 전체 대출의 10%만 허용해왔다. 집단대출 규제에 신협은 고민에 빠졌다. 집단대출 후순위로 밀리면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채무자나 사업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신협 측 주장이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도 현 수준인 7.4%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년간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했다. 규제에서 해방됐지만 이전만큼 자유로운 영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신협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취급한도가 큰 조합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소규모 조합은 영세 시공사에 대출을 하게 되고 준공을 못하는 등 부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수요가 전이되면 소비자 금리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부인했다. 오히려 ‘쏠림’ 현상에 의한 부실이 발생할 확률이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물량이 건전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장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애초에 분양률이나 신용등급 등 우량한 사업장만 들어가도록 제한이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사업장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에 한 개 업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한 사업장에 대출이 몰려서 그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확률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취급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신협 자산이나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업장별로 취급할 수 있는 금액은 500억원이 적정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