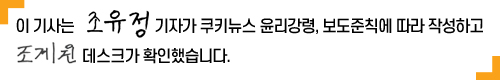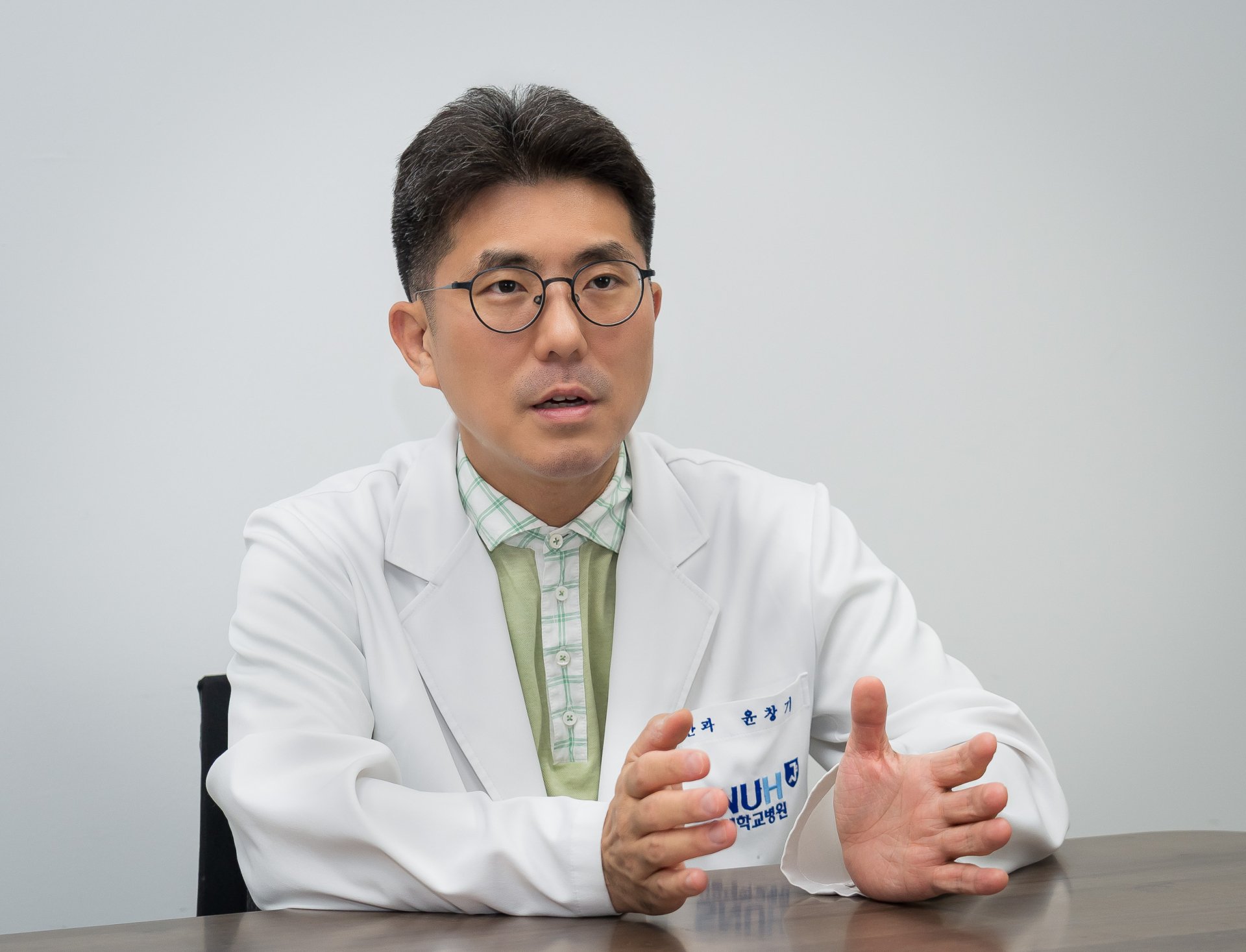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충신1구역. 큰길 사이 놓인 1m 조금 넘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위험 출입금지’ 딱지가 붙은 빈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쌓여있는 고지서와 현관문에 붙은 각종 딱지도 사람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히는 충신1구역은 과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며 한때 활기를 띠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동대문역 인근 대로변에 편의점, 카페 등 상가가 위치하고 사람들이 찾는 것과 달리 충신1구역에 들어설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한 주택은 철거 중으로 공사 소리만 가득했다.
충신1구역은 2005년 처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선정됐다. 충신동 1-183일대, 면적 2만9601㎡, 임대주택 95가구를 포함한 총 545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에는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2006년 조합이 설립됐고 2016년에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재개발 열풍이 불며 원주민은 떠나고 낯선 임차인들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곽마을의 역사 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정비 구역을 직권 해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재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된 상황 속 노후주택에 살 세입자는 드물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빈집 한 채를 방치하면 그 주변으로 폐가가 확산한다. 충신1구역도 재개발 기대감이 꺼지며 빈집이 늘어난 대표적 사례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과거엔 사람도 많이 살고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가득 찼었다”며 회상했다. 이어 “지금은 좀처럼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서 “골목길이 비좁아 사람만 겨우 지나갈 정도라 리모델링도 불가하다. 결국 세를 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노후 주택으로 방치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충신1구역은 2021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 후 다시 한번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 요건을 채우는 중이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 중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며 “태풍이 오면 지붕이 날라가고 특히 달동네에서 경사진 구조 속 빈집 하나가 무너지면 밑에 있는 집들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절반 이상 빈집화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과 해지로 서울 도심 내 슬럼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시스템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6711호의 빈집이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성북구 878호 △용산구 689호 △강북구 512호 △종로구 411호 순서로 많은 빈집이 존재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농촌의 ‘사회적 빈집’과 달리 도심 속 빈집은 정비사업 지연이나 해제로 인해 발생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유입되나 사업이 지연되며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주민 간 갈등은 사업 지연 요소다. 또한, 사업 지연은 정비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결국, 복합적인 요소로 생긴 빈집은 주변으로 번지게 된다.
실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을 통해 당시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93곳을 해제했다. 주민 결정에 따라 해제된 일반 해제 지역이 279곳, 시가 직권 해제한 곳이 114곳이다.
이후 서울시에는 빈집이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 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지 중 10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26가구의 빈집이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1가구 이상 빈집이 생겨난 구역은 38곳에 달했다. 전체 빈집의 55.3%(125가구)의 경우 4개의 구역(종로구 옥인1구역·충신1구역·사직2구역·성북구 성북4구역)에 위치했다.
빈집을 빠르게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다수 빈집촌은 면적이 좁아 사업성이 낮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서울 시내 공급 부족이 누적된 만큼 방치된 구역들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이 빈집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시내 빈집 원인은 재개발의 실패가 크다”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소규모 개발이나 신축 건설 등 행위가 제한돼 개발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정희 연구원도 “서울 시내 빈집은 정비사업 예정이었으나 해제되거나 사업 진행이 안되며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서 “혹은 재개발 기대를 하고 매입 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내 빈집은 도시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고 남아있는 원주민들도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빈집 해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대책을 마련 한 후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재정상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공에서 나서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 대표는 “서울에 빈집이 있다는 것은 거주 수요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빈집을 방치하면 안 되고 유지보수나 주변 기반시설 등을 확보해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요 창출이 불가할 경우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개발보단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