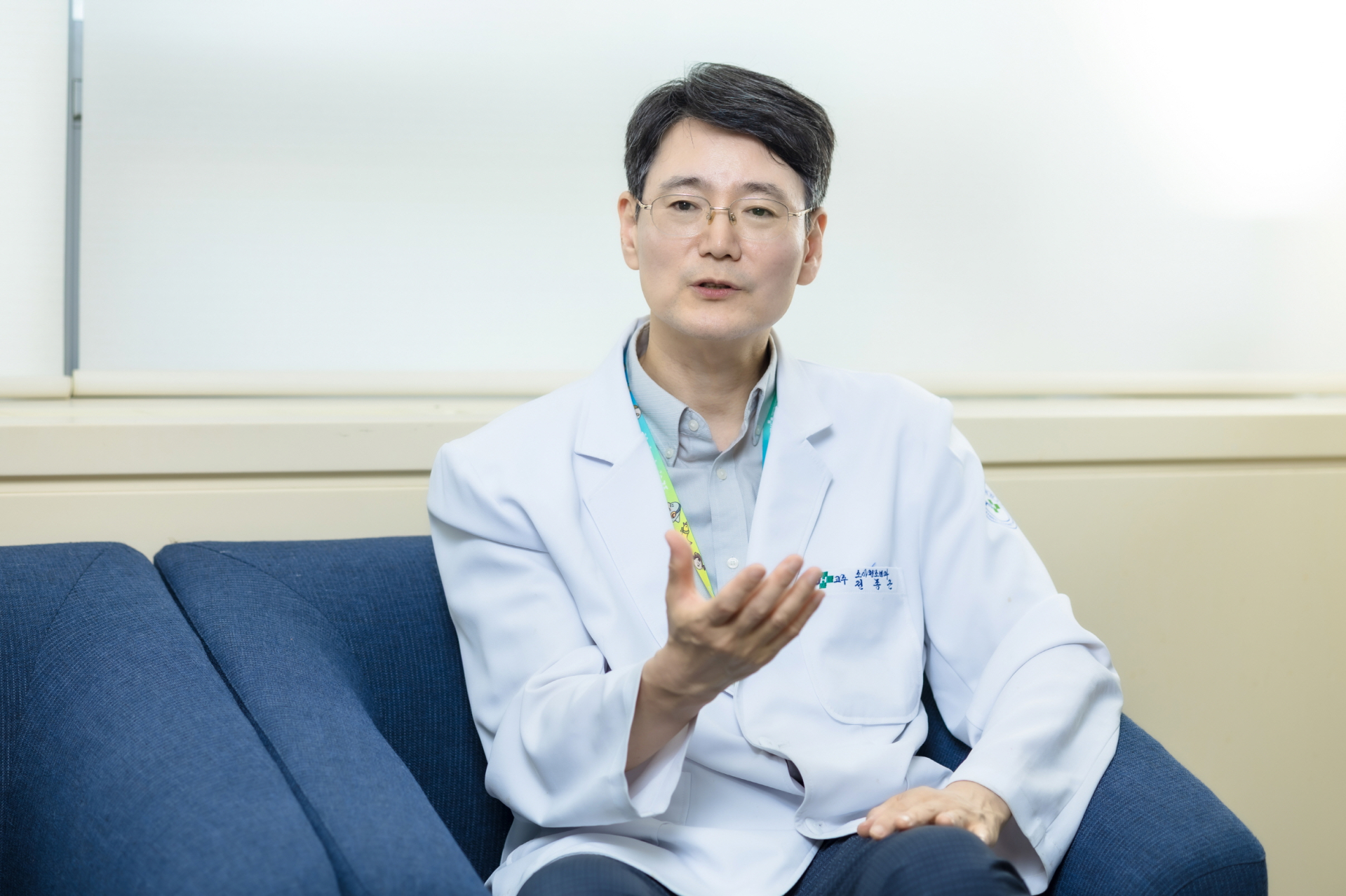[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부산은행이 철강 생산업체 동아스틸에 1000억 원대 대출을 강행하고 부실을 뒤집어쓴 이른바 ‘동아스틸 사태’는 은행의 불투명한 여신심사구조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당시 기업 사정을 뻔히 알고도 대출을 강행한 여신담당자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부산은행이 철강 생산업체 동아스틸에 1000억 원대 대출을 강행하고 부실을 뒤집어쓴 이른바 ‘동아스틸 사태’는 은행의 불투명한 여신심사구조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당시 기업 사정을 뻔히 알고도 대출을 강행한 여신담당자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출 1000억 원 기업에 대출 1000억 원
동아스틸 부실대출은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에 1000억 원(991억 원)대 대출이 이뤄진 점이다. 동아스틸의 지난해 매출액은 1071억 원이다. 그러나 순이익에서 16억 적자를 냈다. 2015년에는 40억 원 적자를 봤다. 동아스틸은 경영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산은행은 동아스틸에 시설자금과 일반자금 등 장기대출금이 290억 원, 기업구매 자금과 수입 신용장 개설 등 대출약정에 들어간 돈 420억 원을 포함해 총 1000억 원 가까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아스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산은행은 충당금을 피할 수 없게 됐고 2분기 실적에도 금이 갔다. 이 과정에서 부산은행은 다른 기업 부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유명무실한 여신심사시스템
유명무실한 은행 여신심사시스템도 문제로 지목받고 있다. 부산은행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동아스틸에 2015년에 150억 원, 지난해에는 35억 원 등 총 18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졌다. 이를 두고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 여신심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00억 원 대출금 회수 ‘불투명’
더 큰 문제는 대출금 회수다. 부산은행 채권 회수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6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후 지난달 8일 회생개시절차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2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실사과정에서 장부상 재고와 실재 재고 차이가 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도 이를 감지한 듯 동아스틸 여신 등급을 재분류했다. 은행 여신은 건전성 등급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다. 각 단계별로 쌓는 충당금 비율도 다르다. 예를 들어 고정단계인 여신은 20% 이상, 회수의문은 50% 이상 충당금을 쌓는다.
부산은행은 정상으로 분류했던 동아스틸 여신 991억 원을 고정이하로 재분류하고 충당금 583억 원(59%)을 설정했다. 이 비율을 보면 부산은행 스스로도 동아스틸 대출금 회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대규모 담보물을 잡아놨기 때문에 당장 손실로 보기 어렵고 실제 미칠 영향도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은행 부실채권(NPL)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24%로 시중은행 평균(0.7%), 지방은행 평균(1.01%)을 웃돈다. NPL비율은 전 분기 대비 0.24%p 올랐다.
부실대출 강행한 박재경 회장 대행, 입지 ‘흔들’
동아스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부실대출을 묵인한 임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사자인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대행은 동아스틸에 2년간 200억 원의 추가대출을 강행했다. 박 대행은 지난 2015년 부산은행 부행장 겸 여신위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여신운용본부장을 지냈다. 차기 회장 인선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로 오른 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song@kukinews.com